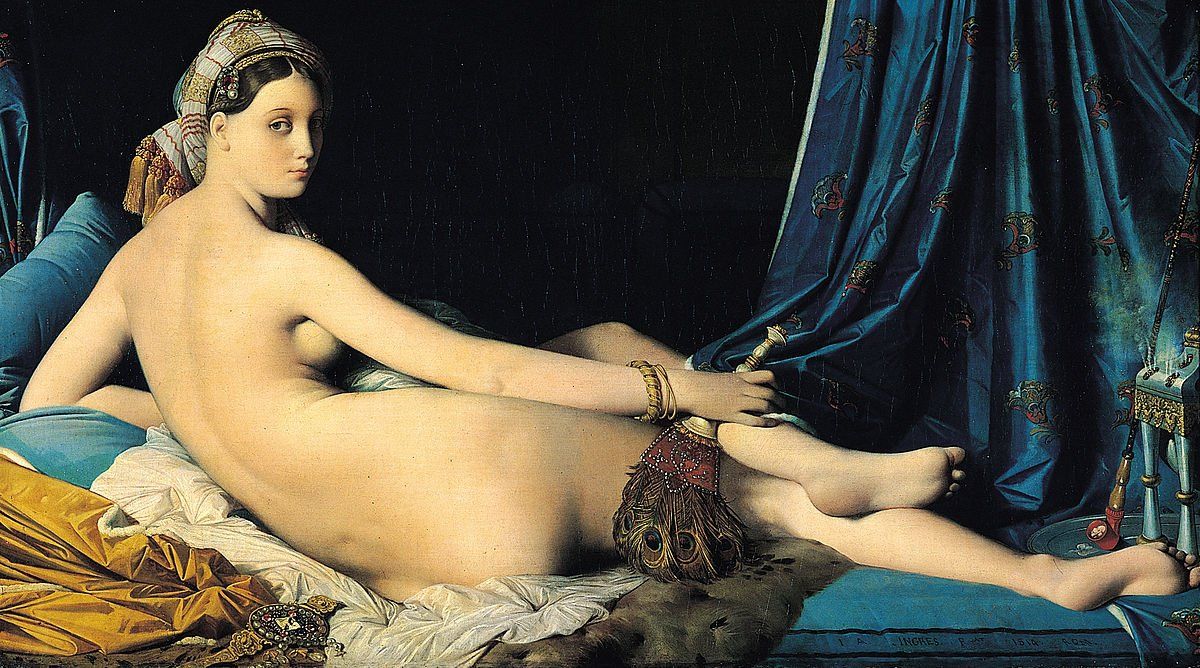중세시대 기독교 미술은 12세기에 등장한 고딕(Gothic) 미술로 절정을 이룹니다. 고딕이라는 이름은 후기 르네상스 미술가들이 자신들의 이전 시대 작품이 너무 소박해서 미개인이나 고트족이 만든 것이 분명하다는 의미로 붙인 이름인데요. 조롱조에 가까운 표현이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관행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유럽은 도시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자 생활의 중심지인 성당이 도시 중심지에 대규모로 지어졌는데요. 이런 고딕 건축 양식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생 드니 왕립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쉬제르였습니다. 그는 ‘현세에 묶인 인간의 정신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진리를 인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의 관점에 따라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당을 짓기 위한 고민이 꾸준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의 건축가들은 어떻게 하면 성당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 또 거듭했습니다. 신에게 가까워지고 싶은 열망이자 중세 후기로 접어들수록 떨어져 가는 교회의 권위를 되살리기 위함이었죠. 늑공 궁륭과 부연 부벽 등 건축 기법의 발달로 건물의 높이는 점점 더 높아졌고, 성당의 벽은 더욱 얇아졌습니다.
높이 솟아오른 교회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긍지를 높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신분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건립에 참여했죠. 귀족과 귀부인들이 채석장에서 가져온 돌을 마차로 실어날랐고, 푸주간 주인, 미장이 등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업적 특성을 살려 힘을 보탰습니다. 때때로 수백년에 걸쳐 작업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교회는 여러 양식이 뒤섞여 나타나기도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하나의 성서에 가까웠습니다. 우선 건축가들은 보다 넓게 벽을 트고 그 자리를 화려하고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로 채웠는데요. 이는 수도원장을 비롯한 교회의 관계자들이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 신의 빛을 반영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영롱한 빛깔의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들기 위해선 끓는 액체 유리 속에 구리, 망간, 철 등 금속 산화물을 적절히 배합하여 원하는 색상을 만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창문은 화려하고 숭고한 시각적 효과를 불러일으켜 교회의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되새겨주곤 했습니다.

조각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로마네스크 양식과 달리 침착하고 인자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좁아진 기둥에 맞춰 길고 야윈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고딕 조각의 특징 중 하나죠. 고딕 초기 조각의 경우 육체를 사악한 것으로 보아 다소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후기로 접어들수록 육체와 감정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서 차츰 생동감 있는 방식의 묘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